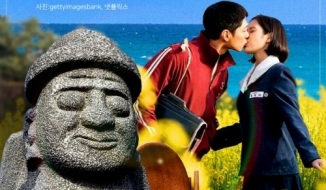|
10일(현지시간)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희생된 태국인은 46명으로, 전쟁 초기에는 미국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외국인 희생자로 기록됐다. 억류된 외국인 인질 가운데는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태국보다 임금이 높은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 키부츠에 일하러 간 노동자들이었다. 하마스가 두 차례에 걸쳐 태국인 인질들을 석방했고, 태국 당국은 이제 1명의 인질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마지막 송환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하마스에 인질로 잡히는 '난리'에도 이스라엘 내 태국인 노동자의 수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 늘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 이스라엘에서는 약 3만명의 태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다. 하마스의 공격과 태국인 인질 발생 이후 태국 정부가 나서서 약 7000명의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주재 태국 대사가 밝힌 이스라엘 내 태국인 노동자의 수는 3만8000명이 넘는다. 전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하며 노동력 부족에 직면한 이스라엘이 더 높은 임금과 인센티브를 보장하자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다시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농업부는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취업 비자 연장과 매달 500달러(약 72만 6000원)정도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태국 노동부도 지난해 3966명의 근로자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이스라엘은 태국인 노동자 4대 해외송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태국인 노동자들이 떠난 빈자리를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채우자, 떠났던 태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되돌아 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한때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크게 의존했지만 1987~1993년 약 6년 가까이 진행된 제1차 인티파다(이스라엘의 점령에 맞선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 이후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데려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무슬림'이 아닌 '불교'국가에서 온 태국인 노동자들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2013년부터 이스라엘과 태국이 체결한 농업 분야 근로자 도입 협정이 시작되면서 수만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건너갔다. 이들 대부분은 태국에서도 빈곤한 지역으로 꼽히는 북동부 출신으로 이스라엘에 가기 위해 평균 10만바트(약 429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로 가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빚을 내서라도 이스라엘로 가는 까닭은 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최소 3배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태국의 월 평균 임금은 1만 6000바트(약 68만원)인데 이스라엘에서 일할 경우 5만5000바트(약 236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우돈타니 농가 출신의 차이윳(35)씨는 본지에 "평균 임금으로 계산해서 3배라는 것인데, 빈곤한 지역엔 소득이 평균 임금의 절반인 경우도 많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임금은 체감상 6~7배일테고, 경제가 더 어려워진 현재는 그 이상도 될 것"이라며 "가족이 다같이 평생 가난하게 사느니, 나 하나 위험을 무릅쓰는게 낫다며 잔류한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