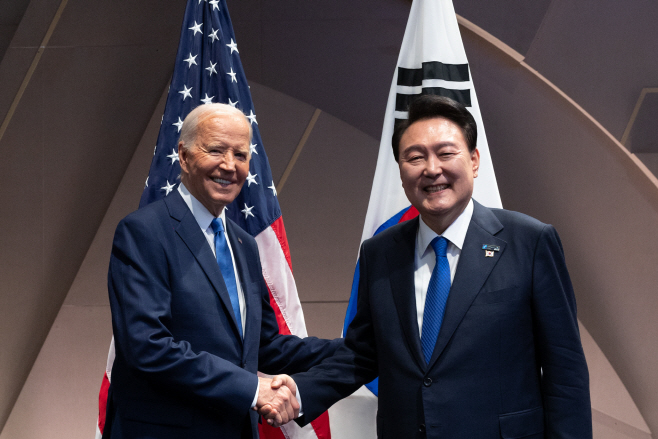|
이런 느낌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 일이 있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질문을 건넸다. "한국의 독자핵무장론이 과거 음지에서 논의됐다면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정부에선 이에 대비한 유의미한 작업이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최근 수차례 외교부 고위당국자들과 여러 번 식사를 하며 공통된 질문을 건넸지만, 대부분은 이에 대해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았다. 화제를 급히 돌리거나 아예 다른 말을 하며 회피하는 게 분명히 느껴졌다. 당시엔 속으로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뭔가 대비하고 있는 게 있겠네'라고. 그런데 한 당국자는 이에 대한 질의를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했다.
"정부도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겁니다", "네 미국에 로비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인가요?". 수초 간 정적이 흘렀다. 그가 이내 조심스레 입을 뗐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과거 한·미 미사일지침을 보면 아실 겁니다. 미사일지침을 보면 사거리 300km에 탄두중량은 500kg에 묶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무제한으로 풀렸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고 안보입니다"라고 말이다.
이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실상 정부가 독자핵무장 가능성에 무언가 대비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로 받아들였다. 과거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을 수직 개선한 것처럼 핵무장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당국자의 마지막 말은 기자를 아리송하게 했다. "하지만 미사일과 핵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젭니다. 미사일이 재래식 전력이라면 핵은 차원이 다른 비대칭 전력입니다. 단순 비교할 순 없겠지요".
그럼에도 이 말엔 많은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했다. 기자의 질문에 항상 대답하지 않던 고위당국자들을 보며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그 대답이 질의에 대한 '예스 or 노'는 아니었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것"이라는 답은 사실상 정부가 독자핵무장 가능성에도 분명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들도 이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 나라의 핵무장엔 관계부처가 없을 만큼 국가의 모든 역량이 투입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더구나 북한의 직접 카운터파트인 통일부와 핵무장에 필요한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외교부 당국자들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그들이 기자의 질의에 "아니다", "한국은 분명한 비핵화 기조를 지키며 앞으로 독자핵무장에 대해 고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등의 확실한 부정을 하지 않았다.
한국의 독자핵무장의 길이 과거엔 말도 안 되는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안보환경이 급변하면서 이제 독자핵무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때가 됐다.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안보에 있어 굉장히 고무적인 일임에 틀림 없다. 혹자는 핵무장을 하면 강력한 경제제재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안보가 무너지면 나라는 송두리째 없어진다. 독자핵무장은 오직 국가의 안보와 국익에 기초해 판단해야 한다.
|